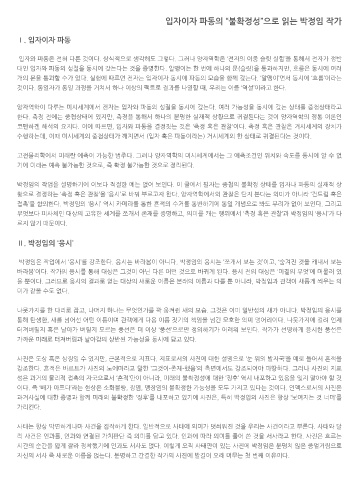Page 106 - PhotoView eMagazine 2023.9 issue27
P. 106
입자이자 파동의 “불확정성”으로 읽는 박정임 작가
Ⅰ. 입자이자 파동
입자와 파동은 전혀 다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정반
대인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알맹이는 한 번에 하나의 문(슬릿)을 통과하지만, 흐름은 동시에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 실험에 따르면 전자는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의 모습을 함께 갖는다. ‘알맹이’면서 동시에 ‘흐름’이라는
것이다. 동일자가 동일 과정을 거쳐서 하나 이상의 팩트로 결과를 나열할 때, 우리는 이를 ‘역설’이라고 한다.
양자역학이 다루는 미시세계에서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 상태를 중첩상태라고
한다. 측정 전에는 중첩상태에 있지만, 측정을 통해서 하나의 분명한 실재적 상황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정통 이론인
코펜하겐 해석의 요지다. 이에 따르면, 입자와 파동을 결정짓는 것은 ‘측정 혹은 관찰’이다. 측정 혹은 관찰은 거시세계의 장치가
수행하는데, 이때 미시세계의 중첩상태가 깨지면서 (입자 혹은 파동이라는) 거시세계의 한 상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고전물리학에서 미래란 예측이 가능한 범주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에서는 그 예측조건인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
기에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즉 확정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된다.
박정임의 작업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예는 없어 보인다. 이 글에서 필자는 중첩의 불확정 상태를 입자나 파동의 실재적 상
황으로 결정하는 ‘측정 혹은 관찰’을 ‘응시’로 바꿔 부르고자 한다. 양자역학에서의 관찰은 단지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드림 혹은
접촉’을 함의한다. 박정임의 ‘응시’ 역시 카메라를 통한 흔적의 수거를 동반하기에 동일 개념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사체인 대상의 고유한 세계를 쪼개서 존재를 증명하고, 의미를 캐는 행위에서 ‘측정 혹은 관찰’과 박정임의 ‘응시’가 다
르지 않기 때문이다.
Ⅱ. 박정임의 ‘응시’
박정임은 작업에서 ‘응시’를 강조한다. 응시는 바라봄이 아니다. 박정임의 응시는 ‘쪼개서 보는 것’이고, ‘숨겨진 것을 캐내서 보는
바라봄’이다. 작가의 응시를 통해 대상은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응시 전의 대상은 ‘미결의 무엇’에 머물러 있
을 뿐이다. 그러므로 응시의 결과로 얻는 대상의 새로운 이름은 본래의 이름과 다를 뿐 아니라, 박정임과 관객이 새롭게 씌우는 의
미가 같을 수도 없다.
나뭇가지를 한 다리로 잡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를 꽉 움켜쥔 새의 모습. 그것은 이미 일반성의 새가 아니다. 박정임의 응시를
통해 탄생한, 새를 넘어선 어떤 이름이며 관객에게 다음 이름 짓기의 책임을 넘긴 모호한 의미 덩어리이다. 나뭇가지에 걸려 언제
터져버릴지 혹은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풍선은 더 이상 ‘풍선’으로만 정의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작가가 선명하게 응시한 풍선은
가까운 미래로 터져버림과 날아감의 상반된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사진은 도상 혹은 상징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표다. 지표로서의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눈 위의 발자국’을 예로 들어서 흔적을
강조한다. 흔적은 바르트가 사진의 노에마라고 말한 ‘그것이-존재-했음’의 측면에서도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진의 지표
성은 과거의 물리적 접촉의 자국으로서 ‘흔적’만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정성에 대한 ‘징후’ 역시 내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즉 ‘배가 아프다’라는 현상은 소화불량, 장염, 맹장염의 불확정한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덱스로서의 사진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과 함께 미래의 불확정한 ‘징후’를 내포하고 있기에 사진은, 특히 박정임의 사진은 항상 ‘보여지는 것 너머’를
가리킨다.
사태는 항상 막연하게나마 사건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태에 의미가 덧씌워진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사태와 달
리 사건은 인과를, 인과와 연결된 가치판단 즉 의미를 담고 있다. 인과에 따라 의미를 풀어 쓴 것을 서사라고 한다. 사진은 흐르는
시간의 순간을 얇게 잘라 정착했기에 인과도 서사도 없다. 이렇게 오직 사태만이 있는 사진에 박정임은 분명치 않은 중얼거림으로
자신의 서사 즉 새로운 이름을 얹는다. 분명하고 간결한 작가의 사진에 발길이 오래 머무는 첫 번째 이유이다.